|
|
|

|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1788~1860)는 반이성 금욕주의 철학자이다. 세계는 이성이 아닌 의지의 표상이며, 혼돈(chaos) 그 자체라고 본다. 그러한 의지의 세계는 고난의 세계이다. 왜냐하면, 의지는 만족될 수 없으므로 인간은 불행하고, 만약 의지가 만족되면 권태가 찾아오므로 불행해진다. 세계는 여러 의지의 충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 인간은 고통받게 된다.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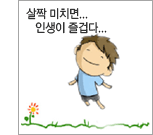 고통에서 피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고통의 세계로부터 마지막 피난처는 자살이다. 그러나 죽음은 개별적인 것일 뿐, 살려는 의지는 종을 통해 지속된다.그러면 살아있으면서 고통을 피할 수 없을까?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답은 바로 ‘정신병’ 혹은 ‘광기’이다. 그 광기를 철학, 예술, 천재 그리고 종교, 이 네 가지 요소에서 찾아본다. |
 쇼펜하우어 역시 예술이 가상, 속임수, 픽션, 나아가 자기기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에게 예술은 각성된 의식의 일시적인 마취제였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은 거대한 ‘연극’이다. 쇼펜하우어 역시 예술이 가상, 속임수, 픽션, 나아가 자기기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에게 예술은 각성된 의식의 일시적인 마취제였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은 거대한 ‘연극’이다.
이렇게 쇼펜하우어에게 예술은 우리의 삶이 의지의 명령에서 벗어나 모든 번뇌를 종식시켜주는 상태, 즉 무(無)로 들어가게 되는 상태, 즉 불교적 의미의 해탈의 상태의 일시적인 예기이자 선취이다.
|
 일상적 욕망과 필요에 사로잡혀 끝없이 변하는 육체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자는 불변의 진리에 전념할 수 없다. 때문에 어떤 ‘태도’ 즉 의지와 거기에 종속된 육체의 부정이 진정한 인식의 전제조건을 이루고, 이 위대한 ‘부정’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미(美)’이다. 일상적 욕망과 필요에 사로잡혀 끝없이 변하는 육체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자는 불변의 진리에 전념할 수 없다. 때문에 어떤 ‘태도’ 즉 의지와 거기에 종속된 육체의 부정이 진정한 인식의 전제조건을 이루고, 이 위대한 ‘부정’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미(美)’이다.
오직 미(美)만이 인간을 최소한 일정한 시간 동안이나마 사로잡아 그가 현존재의 제약성, 자기의 의지와 육체의 자극을 잊게 만들어 준다.
|
|
“인간이 미에 탐닉하는 한 그는 모든 욕망과 필요에서 자유롭고 속에서 참을 인식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예술은 대상을 세계 진행의 흐름으로부터 떼어내어 그것을 고립시킨다. 그 순간 시간의 수레바퀴가 멈춘다.” - 쇼펜하우어 | |
| |
 오직 어떤 대상을 그 ‘미’에 힘입어 의지로부터 떼어놓을 때에만 주체는 의지에 복무하는 데에서 해방되어 순수 객관적인 관조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오직 어떤 대상을 그 ‘미’에 힘입어 의지로부터 떼어놓을 때에만 주체는 의지에 복무하는 데에서 해방되어 순수 객관적인 관조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또, 그때에만 우리는 끝없는 욕망과 성취의 물결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된다. 이때 인식은 의지에 복무하는 노예노동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게 된다.
이 순간 우리는 의지의 충동을 벗어버리고, 의지의 강제노동이 취하는 휴일을 축하한다.
|
|
인간은 의지가 대부분이고, 천재는 인식이 대부분이여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천재와 여자는 적대관계에 있다고 한다. 여자는 생식의 화신으로 지성을 살리려는 의지와 생명을 낳으려는 의지에 복종하려 한다. |
| |
 |
| |
쇼펜하우어의 논리에 따르면, 여자는 의지의 화신이여서 뛰어난 재능은 가질 수 있지만 천재는 되지 못한다. 천재는 정신의 객관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 자연은 오직 소수에게만 천재성을 부여했다. 이는 천재적 기질은 정상적인 생활의 추구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
인식은 의지에서 생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지배한다. 복잡한 카오스의 세계를 개념적으로 인식하고 분류하면서 철학은 의지를 정화한다.
종교를 통해서도 의지의 정화는 가능하다.
기독교는 염세적인 현실의 혼돈과 그로인한 인간들의 고통을 인정한다. 불교는 의지의 파괴를 종교의 전부로 보고 열반을 모든 개인적인 발전의 목표로 하고 있다.
당신은 미친, 혹은 미칠 수 있는 행운아인가? | | | |
|
|
| |